천문도와 주역이 사람과 관계가 있을까?
아니 무엇인가 그 개념을 알아야 상관관계를 알수 있겠지요.

"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즉위해서부터 하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새 왕조의 왕으로서의 권위의 표상으로 새로운 천문도를 갖기를 염원하였다.
그 염원은 권근, 유방택, 권중화등 11명의 천문학자들의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성취되었다.
그것이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이름의 천문도 석본이다.
당시 고려에 의하여 계승된 고구려 천문도의 인본(印本)도 매우 희귀해졌는데, 태조가 즉위한 지 얼마 후 그 인본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
태조는 매우 진귀하게 여겨 그것을 다시 간행하게 하였으나,
서운관에서는 그 연대가 오래되어 별의 운행하는 정도에 오차가 생겼으므로 새로운 관측에 따라 오차를 교정하여 새 천문도를 작성하기로 하고,
새로 〈중성기(中星記)〉 한 편을 편찬하여 그에 따라 성도(星圖)를 돌에 새겨 완성한 것이다. " (가져온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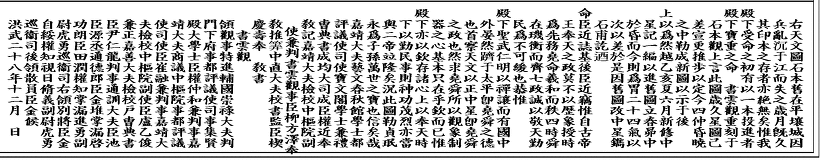
아래는 천문도중 별자리 그림 있는 부분만 따 온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황도와 적도가 가운데 서로 조금 엇갈려 그려져 있고(2개 그려진 원, 태양이 적도를 남북으로 23.5도 오르락거리는 것을 나타냄)
황도 주변에 28수 별자리가 그려져 있고, 그 주변에 많은 별자리들이 그려져 있지요.
그리고 큰 원 주변에 360개의 눈금이 있고 그 바깥에 방향과 시간을 알수 있도록 자축인묘~ 12지지 등이 표시되어 있지요
천문도내 전 별자리가 이 한 눈금 만큼 움직이는 데 72년 걸린다고 합니다.
즉 72년 * 360도= 25,920년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지구의 자전축이 세차운동을 하여 원위치 하는 시간을 의미 하는 것이지요.
(서양과학은 지구 세차운동을 약 2만6천년이라 한다)
" 서운관에서는그 연대가 오래되어 별의 운행하는 정도에 오차가 생겼으므로 새로운 관측에 따라 오차를 교정하여 새 천문도를 작성하기로 하고"
조선시대에도 일정 시간이 자나면 별자리고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지구에서 바라본 우주의 움직임을 보이는 별자리로 표현 한 것이 천문도 즉 천상열차분야지도 인거지요.
이는 거꾸로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음을 아는 것이고....

그림을 보면
동방 청룡 각항저방심미기..로 시작하는 사방 28수의 별자리가 황도 주변에 그려져 있고요.
황도라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면 개념이 안 잡히고.... 해가 움직이는 길이다 생각하면
해가 뜨고 지는 길 따라서 밤이면 저런 별자리(28수)가 보인다고 표시한 그림인 셈이지요.
한마디로 사계절중 어느 때에 즉 요즘 같은 "입춘때에는 삼경(자시)에 남중하는 별자리가 무엇이다" 이런 것을 그린 거지요.
해와 달이 지고 뜨는 것을 보고 하루 그리고 한 달이 가는 것을 알 수 있고
북둑칠성을 비롯한 28수의 별자리의 위치가 변함을 보고 1년이 지나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지구 주변의 해, 달 , 8개 행성, 그리고 별자리를 보고서 자연의 변화 즉 우주 자연의 이치를 파악 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별(해, 달도 별이니까)을 보고 그 위치를 천문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달리 얘기 하자면 지금 어떤 별자리가 어디에 있으니까 어느 때라고 알 수 있도록 그린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내가 어떤 계절 어떤 처지에 있는 가를 천문도를 해석하여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즉 내가 속한 땅(지구)가 주변 우주(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지구의 일부인 우주의 일부인 사람도 동일한 영향을 받아 살고 있으니
그 이치를 파악하여 우주 자연의 이치에 따라 순리대로 살아라 이런 것이지요.
그럼 주역은 무엇 일까~요?
주역이 주역점 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에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에~ 괘상을 어떻게 표시하여 설명 해야 할까...
☰☰☰☰☴☶☷☷☷☷☳☱
☰☴☶☷☷☷☷☳☱☰☰☰
아 괘를 그리려 하니 참 힘들다
64괘중에서 12괘를 찾아 그린거네요.
제일 앞의 ☰☰ 건위천태양 괘이지만 양이 지극한 즉 1년중 가장 긴 夏至괘로도 볼 수 있지요.
건위천 괘는 지극한 양의 순양의 괘로 괘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지요.
이 괘에서 부터 1달 1효씩 음이 더 해 즉 초효가 음괘로 변하여
☰☴ 천풍구일음괘지만 하지에서 1달 지난 大暑를 나타내는 괘라고 볼 수 있지요
이렇게 한효씩 바뀌어....
☰☷ 천지비윤도괘이지만 계절로 보면 낮과 밤이 같은 추분괘가 되는 거지요
아 이제 부터 陰이 더 커지니 밤이 길어지고 추워지는구나, 아 살기 힘들겠다....
이렇게 보면 천지비괘는 좋은 괘가 아닌 거지요.
그리고 ☷☷ 곤위지산하괘 즉 동지에 이르고
이후 다시 양이 하나씩 자라나서 ☷☳ 지뢰복일양 동지후 1달후인 大寒 괘라 할수 있지요
춘분괘인 ☷☰ 지천태무궁 음과 양이 같은데 이제부터는 陽(해) 커지니 낮이 길어지고 살만 하겠다.그래서 지천태괘는 좋은 괘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12달 만에 다시 하지에 원위치 하는 괘상이 변화를 알 수 있지요.
주역이 점치기 위한 것이지만 , 일면 이렇게 자연의 변화를 괘상으로 표현 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팔괘의 조합으로 64괘가 만들어 지는데, 이는 점을 친 사람의 그때의 상황을 나타 낸 것이니까
이 상황을 잘 파악하여 처신하라는 것이지요.
주역점이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괘상을 통하여 처해진 위치에서 어떻게 처신 할것인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란 거지요.
일단 천문도와 주역의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천문도를 통해 즉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구나(사계절 어느 시점이 있다)
또 주역점으로 괘상을 뽑아 지금 내 처지를 알수 있으니 어떻게 행동하라고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 할 수 있겠지요.
천문도는 자연의 변화를 보이는 별자리를 통해서 보여 주는 것이고,
주역은 자연의 변화를 괘를 통해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 자연의 일부인 소우주 사람이
우주변화의 이치에 따라 잘 적응하며 살기 위한 지침인 거지요.
고대의 황제는 황제내경을 통하여 지구 주변의 변화를 오운육기로 설명 하였지요.
동양에서는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의 변화(運氣)를 알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의 결론이 음양오행론이며 오운육기론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오운육기는 보이지 않는 기(氣)를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현대과학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납득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향(天氣)을 표현한 것이 오운(五運)으로 목(木),화(火),토(土), 금(金),수(水) 운 이고
지구(땅)의 영향(地氣)을 표현 한 것이 육기(六氣)로 궐음(厥陰),소음(少陰),소양(少陽),태음(太陰),양명(陽明),태양(太陽)입니다.
하늘의 기운변화 즉 오운(五運)은
태양을 비롯한 달과 오행성,북극성을 비롯한 28수의 별등에 의한 기운에 의해 지구의 기운이 어떤 규칙성 띠고 변화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땅의 기운변화 즉 육기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도는 공전에 따른 기운의 규칙적 변화를 표현 한 것입니다.
10天干 12地支에 의한 육십갑자로 이 변화를 표현 한 것이 황제내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운기론(運氣論)입니다.
주운과 객운 주기와 객기로 세분하여 이론이 전개 되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고....
음양오행이 작게는 해,달, 오성(수성, 금성, 화성, 목성,토성)을 의미하지만
크게는 칠요(七曜)로 북두칠성을, 28수의 사방 칠수(ex 각항저방심미기/동방)을 의미 하는 것으로
지구 주변의 별들이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우리 몸도 이 처럼 오장육부가 상호간의 영향을 주면서 질서롭게 움직인다고 본 것입니다.
황제는 황제내경에서
지구의 일부인 사람에 영향을 주는 기운의 요소를 오운육기로 해석하고
소우주인 사람의 오장육부를 오운육기에 대입하여 장부, 경락의 성질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기의 변화에 따라 해당 장기가 영향을 받아 병이 생기는 것과 이에 따라 치료하는 것을 체계화 시킨 것입니다.
즉 오운의 목,화,토,금,수를 肝 心 脾 肺 腎 및 生,長,化,收,藏 으로 표현하고
육기를 궐음-風, 소음-熱, 소양-暑, 태음-濕, 양명-燥, 태양-寒으로 표현하여 사람에 미치는 요인을 설명한 것입니다.
오운과 육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氣)이고
이런 氣가 흐르는 통로가 경락이고, 수족 각 6경락의 12경락과 기경팔맥 입니다.
예를들면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이라 표현 하여, 방광경락을 타고 방광으로 흐르는(들어가고 나오는) 기운을 태양으로 표현 한 것 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태양, 소양 등 6가지 기운(六氣)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보다 쉽게 오장육부를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오운육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장기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 주변환경의 변화(기운의 변화)를 오운육기로 표현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무생물이 이 영향권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지구의 일부분인 사람도 이 영향를 배제 할 수 없으며, 오운육기를 이해하여 사람을 이해, 해석 한것이 옛날 동양의학 입니다.
운기를 이해하여 오장육부및 그 경락을 파악하면 동양의학의 해부생리의 개념은 잡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락은 6기의 체계로 경락 이름을 표현 하였기 때문에
경락을 이해 하려면 궐음, 소음 태음, 소양, 양명, 태양의 6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오장 육부 경락의 체계를 음양,오행(상생, 상극).육기(경락)으로 해석하고
각 장부 자체의 음양의 균형과 장부 상호간의 균형을 파악하여, 이들 불균형이 병를 초래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우주자연의 변화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병 들지 않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지요.
병이 왜 생기는가?
한마디로 살고 있는 주변 환경(우주자연)에 적응하지 못하면 병이 나는 거지요.
동양의학(한방)에서 병의 원인을 여러 방법으로 구분하는데
그중 삼인변증은 병의 원인을 삼인 즉 외인(外因), 내인(內因), 불내외인(不內外因)으로 설명 합니다.
외인(外因)은 사람이 외부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몸에 변화가 생겨 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육음(六淫) - 풍(風), 한(寒), 서(暑), 습(濕), 조(燥), 열(熱) -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병이 생긴다고 본 것입니다.
춥더니 감기 왔는지 몸이 아프네 ~
寒(찬기운)이 태양방광경락 유주 부위에 머물러 있으니 근육이 움츠러져(긴장) 아픈 거지요.
이 찬기운을 털어버리려고 우리 몸을 열을 내기 위해서 움직이느라 떠는 거지요,
그래서 춥고 떨리고 아프다 , 이런 거지요
한(寒) 태양기운의 영향 인거지요.
근골에 濕이 침범하여 팔다리 관절이 붓고 아플 경우, 습이 많은 장마철이나 지하실에 기거할 때 더 심하고,
그래서 비 오려면 그런 환자가 "얘 장독 닫아라! 비 올 것 같다" 말하는 것 처럼 습의 영향을 받으면 더 아픈 것입니다.
태음 습(濕)의 영향에 의해 아픈거지요.
이런 육음의 통로 즉 경락이 오장육부로 기운을 전달하는
수족 6경락(六 經絡) 궐음(風), 소음(熱), 태음(濕,) 소양(署), 양명(燥), 태양(寒) 입니다.
이들 육음의 영향으로 해당 경락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경락 및 장부(臟腑)에 병이 난다고 본 것입니다.
육음 즉 外氣의 영향을 받아 병이 생기는데 이를 외인(外因)이라 한 것입니다.
내인(內因)은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영향을 받아 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칠정(七情) - 희(喜,) 노(怒,) 우(憂), 사(思), 비(悲), 공(恐), 경(驚) -
즉 감정변화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것을 말 합니다.
감정의 지나침으로 인하여 우리 몸의 균형, 조화가 흐트러져 병이 생기는 것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민이나 생각이 많으면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을 경험 했을 겁니다.
이는 사(思)가 지나쳐 脾經에 과부하가 걸려 氣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고,
기가 막히게 되어 궁극에는 비장의 균형이 깨지니 비장의 기능이 저하 되고 그래 먹고 싶지 않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이지요.
“아이고 속상해 속상해~” 이럴 때 실제로 속이 상하지 않던가요?
속상한 일이 있어 비장이 탈이 난 것인데, 脾의 한자를 보면 고기肉변에 낮출卑로 되어 있으니
나를 낮추면 뱃속이 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지요.
나를 알아줘야 하는데 몰라주니 속이 상하고, 속이 안 편하고 그럴 수 있겠지요
두려움(恐)의 기운은 膀胱 경락으로 흐르는데,
이 경락은 눈 안쪽에서 목덜미로 해서 등을 타고 흘러 허벅지 뒤쪽 그리고 오금으로 해서 새끼발가락으로 흐릅니다.
이 통로는 위의 얘기한 육음 중 한(寒)이 흐르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서우면 이 통로가 영향을 받아 寒이 작동하여 추워져 ‘등골이 오싹하다’ 하고,
소위 높은 사람 만나는 자리에 갈 때 ‘오금이 저린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납량특집을 여름에 하는 이유는 더울 때 무서운 영화를 보면 이 방광경락이 자극되어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광이 자극되어 춥거나 무서우면 소변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 되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 것이 기뿜(喜)이 심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화(怒)를 많이내면 간이 안좋은 상태이거나, 간이 나빠지는 거지요.
우(憂)가 많으면 폐가 안좋거나, 폐가 안좋아 지는 것이지요.
심리상태에 따라 몸이 변하여 병적인 상태로 갈수 있다고 보고,
감정 즉 內氣의 영향을 받아 병이 생기는 것을 내인(內因)이라 한 것입니다.
위의 육음칠정을 기(氣)라, 육음칠정이 흐르는 통로가 경락인데
우리 몸에 정경12경, 기경팔맥이 있고 이 경락으로 흐르는 기를 조절하여 병을 치료하는 체계가 예로부터 발전 하였던 것입니다.
즉 육음칠정(六淫七情)이 지나치면 그 때문에 기가 막혀 아프다는 겁니다.
막힌 원인과 해당 경락을 찾아 침이나 뜸을 놓거나 약을 써서 막힌 곳이 풀어지면 아프지 않지요.
기막힌 일이나 속상한 일 때문에 생긴 마음의 찌꺼기(七情 현대의학에서 스트레스 )나
외기(六淫)가 과다하여 해당 경락에 영향을 주어
소통이 원활치 못하는 상태(기가 막혔다)가 병을 가져 오는 거지요.
외부 환경(풍한서습조열,육음)은 문명이 발전 하면서 그 영향이 줄어 들었지만
내부 요인(희노우사비공경,칠정)은 사회가 복잡해 지면서 그 영향이 더 커졌지요.
그러니 이 칠정을 잘 조절 하고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몸의 기의 흐름을 알고 원활게 소통 할수 있게 하느라
기수련을 하고 도를 닦고 그러고 있는 것이며
기감각을 찾아 기의 흐름을 느낄수 있을 때 의자(醫者)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의 흐름(자연의 이치)에 순응하여 사는 것이 병들지 않고 잘 사는 길입니다.
잘 사는 길(道)는 무엇인가?
子曰 朝聞道 夕死可矣
공자왈 아침에 인생의 진리(道)를 깨닫는다면 그날 저녁에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다
대개 이렇게 해석 하고 있지요.
그럼 대체 도가 무엇이기에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을까요?
저 해석이(도를 깨닫는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요
聞은 " 들을 문" 즉 들어서 안다는 소리지요.
글 그대로 번역하자면 " 아침에 도를 들어서 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거지요.
道가 뭘까?
길이라는 거지요.
그럼 길을 찾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
무슨 길을 찾아 ?
잃어 버린 길을 찾는다면......
내가 이승에 태어나서 가야 할 길을 잃어 버리고 사는데 그걸 찾는 거라면...
가야 할 길이 뭔데?
그걸 찾는 게 道라는 거지.
위패나 묘비에 학생(學生)이라 쓰는데 왜 학생이라고 올릴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터 학생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죽어서도 학생이라고 얘기 하는 것이구요.
배울 學, 날 生
태어난 것을 공부 한다
달리 얘기 하자면 공부하러 태어났다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왜 태어났는 가는 알려고 공부 하기때문에 학생이라는 거지요
공부가 다 끝나지 못하고 죽었으니 역시 학생 !
그러니까 묘비에 학생 아무개 이렇게 표시 하는 거지요.
'왜 태어났는 가' 를 알아야 '어떻게 살 것인가' 살 길(道)을 찾아서 도를 깨닫는 거지요.
사람이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윤회 하는 데
소위 '구천을 떠돈다'는 원이 쌓인 귀신들은 저승으로 왜 못 가는 걸까요?
구천을 떠도느라 못 가는 거지요.
가지고 있는 원(원통할 寃)과 恨 때문에 이승을 떠날 수 없는 거지요.(집착 때문에)
이것들을 해원(解冤) 할 때까지는 못가는 거...?
흔히 귀신(鬼神) 그러는 데 귀와 신은 어떻게 다를까요?
鬼가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돌아갈 歸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저승으로 돌아가는 것은 鬼, 돌아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고 있는 것은 神
이렇게 구분한다네요.
죽었는 지 모르고 죽은 경우나 또는 원한이 남아 있어서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흔히 얘기 하는 神(귀신)이라는 거지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생기면 '귀티'가 난다고 대우를 하는데
이 귀티가 귀할 貴티 일까요?
나이가 들어 저승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 돌아라갈 歸티 또는 鬼티가 난다고 하는 거라면......
이승과 저승을 오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사람이랍니다.
저승에서 " 이번에 이승에 태어 나서는 이렇게 살면서 이런 체험을 하여 새로운걸 배우고 오겠다" 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1/7억 정도의 경쟁을 뚫고(정자 약 7억 중에 1등을 하여 난자와 결합)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거지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다는 거지요
사람의 만물의 영장이며 우주의 주재자(主宰者)이며 하나님과 같다는 것은
사람이 우주자연의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태어 나기 때문이지요.
병든 우주를 고치기 위하여 수 없이 윤회하며 그런 우주의 주재자 되려고 이승으로 태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배속에서 나오면서 이 모든 것을 잃어 버린 다네요.
'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가 되어 있으며, 이번에 태어나서는 뭘 공부 하고 가려고 왔는가'
결국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지요.
공부를 통해서 잃어버린 이것을 찾아 그 길을 가는 것이 도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무엇을 공부 하러 온 것인가를 알고 공부 하여야 저승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왜 왔는지를 모르니,
몸이 시키는 대로 살다(본능적으로) 살다 가기 때문에 저승으로 돌아 갈 수 있는 확률이 적겠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도통했다는 말이 있는데
도통(道通)하다 [도ː통하다] 1.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통하다. 2.어떤 일을 잘 알거나 잘하다.
어떤 한 분야에서 높은 경지에 올랐을 때 도통했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요.
즉 자신이 하는 일이 최고의 수준에 이른 경우라 하겠지요.
내가 무엇을 공부하기 위하여 왔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하고픈 일에 열중하여 최고의 수준에 올랐으니
이것이 '내가 이생에 공부하여 터득하고 가는 것'이라 도통했다고 하는 거지요.
도라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집궐중
논어20편
堯曰 咨爾舜 天之曆數在爾躬 允執厥中
四海困窮 天祿永終 舜亦以命禹
요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자, 그대 순이여.하늘의 曆數(역수)가 그대에게 있다.
그대의 중심을 다잡도록 하라. (그러지 못하면) 四海(사해)가 곤궁해질 것이며,
하늘이 내린 봉록도 영원히 끊기리라. 순 임금 역시 우 임금에게 이 命(명)을 물려주었다
人心惟危(인심유위)하고
道心惟微(도심유미)하니
惟精惟一(유정유일)하여
允執厥中(윤집궐중)하라
『인심은 위태롭고, 도덕은 미미하니, 오직 살피고 집중하여 그 가운데를 틀어 잡아야 할 것이다』라는 뜻이다.
書經 虞書 大禹謨篇

청淸 함풍제咸豊帝의 <어필해서御筆楷書> 권券
내안에 우주자연의 이치가 있으니
즉 바로 내가 우주니까
도를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속에 있는 나를 찾으라는 소리
어쩌면
允執厥中(윤집궐중) 하는 도 닦는 법이 황제들의 도법인지 모른다.
요 임금이 순임금에게...
그리고 청 황제가 저런 글씨를 쓴 것으로 보면.....
동물들은 머리가 사람 처럼 발달하지 않아 지식이 부족한 지라
윤집궐중 하지 않더라도 자연의 일부로써 자연의 이치대로 살다 죽기 때문에
책력도수를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기러기 같은 철새가 철에 따라 옮겨 다니고
쓰나미나 태풍이 올 것을 개미 같은 미물이 더 먼저 아는 것 같네.
살아 오면서 오감에 의해 만들어진 지식과 경험등이 머리 속 꽉 차 있으니
내속의 神 즉 우주와 하나인 신을 찾을 수 없다
삼일신고에 나오는
性命精을
心氣身(神氣精)으로 해석 할 수 있지만
性은 불교에서 자성, 본성을 찾으라 하듯이 참나 우주와 하나인 眞我를 말하는 것이고
命은 말 그대로는 생명 즉 현재 살고 있는 나, 오감을 가진 생각을 하는 현상의 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精은 나를 몸 담고 있는 몸둥이라 볼 수 있는데
몸이 나인 것 처럼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본능만으로 사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데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동물 처럼 먹고 사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을거라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내가(진아) 이승에서 뭘 할 것인가 결정하고 온 것이니
내가 이승에서 무슨 경험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 하려는 것인가를 찾는 것이 나를 찾는 길이니
그러려면 유정유일 윤집궐중 하여야 한다.
윤집궐중, 나를 찾는 길이다.(道)
나는 자연과 하나다.
自/스스로 자 然/그러할 연....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이라
꾸미고 가꾸고 연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라
잘 사는 길은
사람이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연의 이치에 따라 자연처럼 자연스럽게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이다.
잘 살아보세~~!
'아리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윤집궐중(조선왕조실록 외) (0) | 2019.06.28 |
|---|---|
| 곤도 (0) | 2018.10.17 |
| 아버지 하느님 (0) | 2018.05.06 |
| 단군은 실존 하였다(개천절에)| (0) | 2015.10.03 |
| 화강수승(火降水昇)/내경도 (0) | 2015.09.09 |
